작년 마스크 대란에 이어 2차 우려 확산…해결책 마땅찮아
전문가 “의약품 유럽 생산? 정부·제약사·보험사 합의 필요”
의약품 생산 대국 인도에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의약품 수급 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회가 웹사이트에서 소개한 인도와 중국의 국제 의약품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은 다음과 같다.
△주요 약물 성분 생산량의 80% △유럽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완제품 약 40% △파라세타몰(해열진통제) 전 세계 생산량의 60% △페니실린(항생제) 생산량의 90% △이부프로펜(해열·소염진통제) 생산량의 50%가 중국산 혹은 인도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도는 특허보호기간이 지난 약물의 복제품인 제네릭 의약품 생산 비중이 크다.
독일은 의약품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지난 2019년 전체 의약품 공급량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독일의 제네릭 의약품 협회, 프로 제네리카(Pro Generika)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서 유통된 제네릭 의약품 중 약 41%가 인도산이다.
게다가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 중심지인 마라하스트라 지역은 현재 중공 바이러스가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럽 각국을 포함한 산업화 선진국들의 높은 의약품 해외 의존도가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중공 바이러스 사태로 방역용품 의존도가 불거진 지 약 1년 만이다.
독일계 전략 컨설팅 업체 ‘롤랜드 버거’(Roland Berger)의 모리스 호세이니는 “특히 기초성분에 있어서 국내에는 생산 기지가 몇 개 남지 않았을 정도로 극히 쪼그라들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서로 다른 항생제라 하더라도 기초 재료 생산을 같은 공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제약학과 울리케 홀츠그라베 교수는 주요 의약품 생산이 생산자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공급 사슬이 취약해져 자연재해의 위험과 기술적 장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독일 제네릭 의약품 협회의 볼프강 슈패스 협회장도 작년 10월 한 강연에서 “신종 코로나 1차 위기 때는 독일에 의약품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도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로 중공 바이러스 사태 이전인 지난 2016년 가을, 중국 지난(濟南) 지역의 한 공장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 여러 국가에 수주~수개월간 피페라실린(페니실린계 항생제) 공급 부족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중국, 인도 하청생산의 주된 원인은 제약사 간의 무자비한 가격 전쟁이다. 시장 논리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경쟁자가 우위를 차지하는데, 인도가 그렇다.
의료보험 회사와 제약회사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인 계약도 가격 전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의약품 업계 특유의 요소다.
언론을 중심으로 의약품 품귀 우려가 치솟자 독일 정계도 술렁이고 있다.
독일은 이미 지난해 마스크 대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옌스스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작년 10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유럽산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다시 자극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뷔르츠부르크대 제약학과 홀츠그라베 교수는 “단기간 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집단 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 생산할 것인지 혹은 유럽에서 생산할 것인지, 생산한다면 어떤 약물을 생산할 것인지 국가와 제약회사, 의료보험사들이 먼저 합의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충돌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홀츠그라베 교수는 “이런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장려 대책을 통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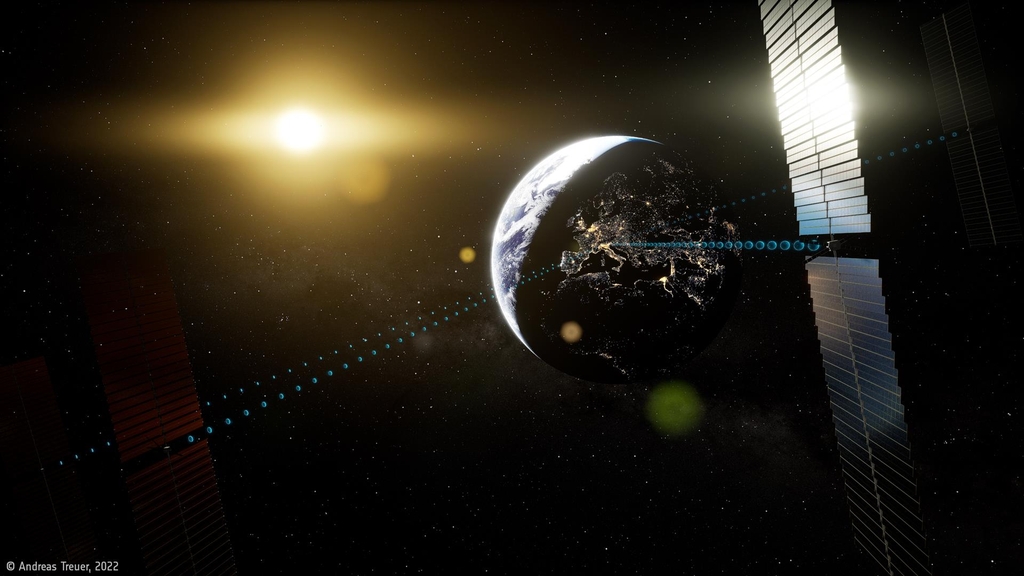

![[태양의 길, 24절기] 생명의 비, 곡우(穀雨)…봄비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하는 날](https://kr.theepochtimes.com/assets/uploads/2024/04/888-235x132.jpg)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다…기나긴 ‘검열’의 역사 [프리덤퍼스트]](https://kr.theepochtimes.com/assets/uploads/2024/04/fffr-235x132.jpg)
![먹거리만으로도 우울·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핵심 영양소 3가지는 [바이탈사인]](https://kr.theepochtimes.com/assets/uploads/2024/04/sss-1-235x132.jpg)